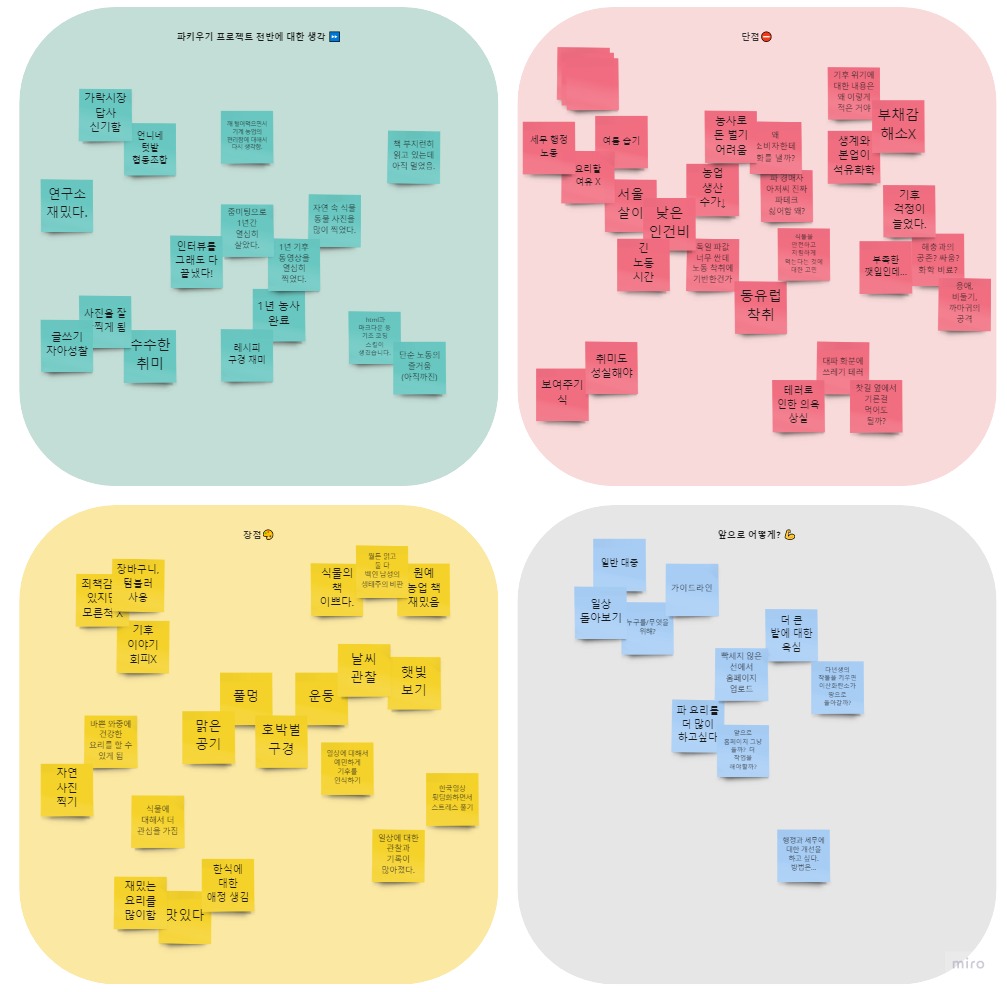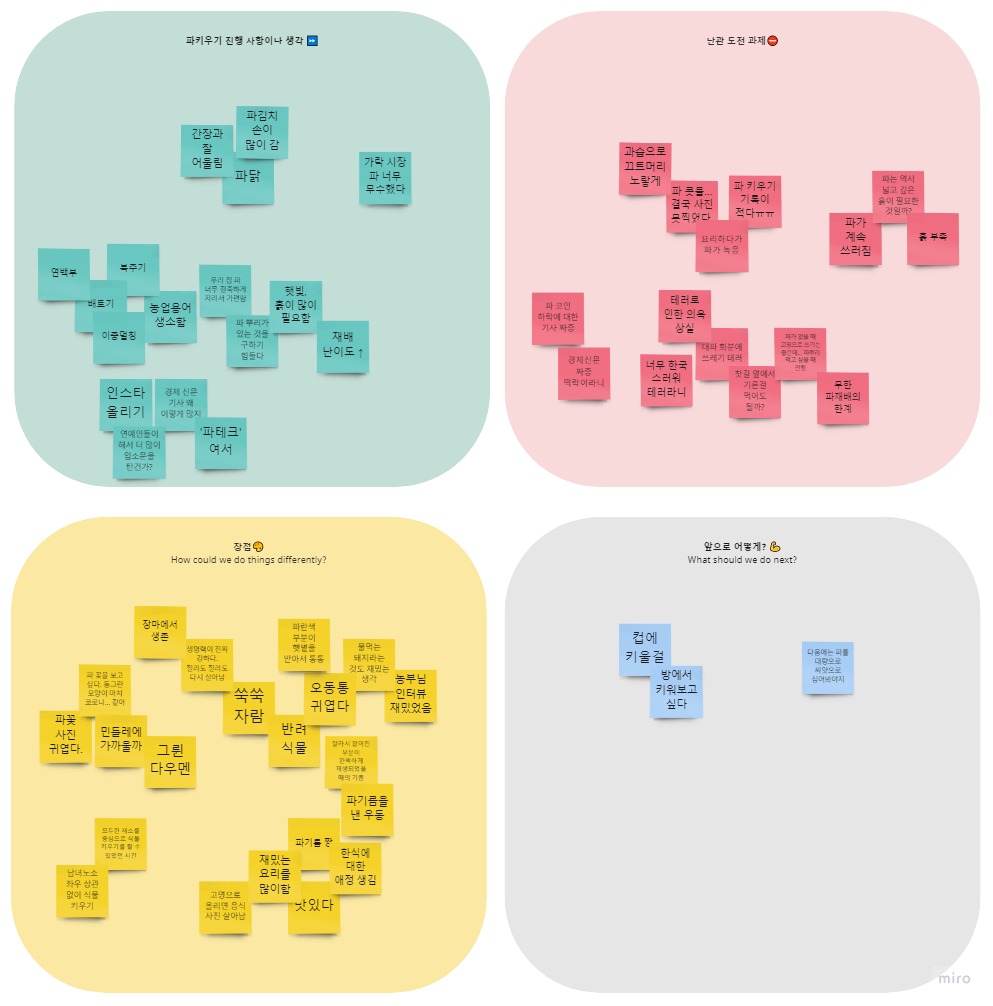소개

홍남명, 차혜림으로 구성된 갈무리는 2017년부터 서울과 베를린에서 지내며 근대 도시가 형성되는 역사와 기반 시설에 대한 자료를 모으며 의견을 나누어 왔다. 2020년에는 예술인 문화활동 <190시간> 사업을 통해 코로나 유행 이후 국가 차원의 조치를 시민 입장에서 체감하며, 도시 인프라에서 소외되는 여성, 빈민, 개발도상국의 위치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환경 문제를 다루었다.
올 해 갈무리는 봄날의 우박, 너무나도 습한 여름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에 대해 안부를 나눈 기억을 살려, 기후 위기에서 파생한 인간과 식물의 교류 사례를 살피면서 미시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해본다.
징후
올해도 우리 둘은 베를린과 서울의 상황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고 해가 들지 않는 날씨가 공통적임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온난화가 아닌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서울에 있는 차는 코로나 때문에 공공 체육관이 닫아 운동삼아 성미산을 다닌다. 성미산은 봄마다 벚꽃을 보려 오르던 곳이었다. 따뜻한 날씨 탓인지 개화가 빨라져 3월 중순에 벚꽃이 피고 4월이 되자마자 꽃이 졌다. 그리고 5월 내내 이어진 이상기후와 습도로 성미산 생태 습지의 관목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었다. 차의 어머니는 벚꽃 나무가 빨리 자라 꽃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야 한다며 불평했다. 아침에도 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우거진 산책길이 위험해 보인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고 식물도 사람도 해를 보기 어렵다.
베를린에서 홍은 4월에 우박과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놀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되너가게 주인 아저씨는 홍에게 “날씨가 X같아(Das Wetter ist Scheiße)”라고 했다. 그래도 5월 말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져 베를린에서 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가 떴다가 10분 뒤 천둥번개가 치는 변덕스럽고 추운 날씨에 그마저도 어렵다. 그리고 작년에 수확한 깨를 심었지만 추운 날씨에 떡잎들이 얼어버렸다. 키운 지 한 달이 다되어도 깻잎이 나오지 않아 홍은 답답하고 난방비가 걱정이다.
지역은 다르지만 전지구적인 기후 문제는 각자가 마주하는 식물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수준의 변화에 기대어 둘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식물과 인간의 공존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치솟는 파 값 그리고 파테크
둘은 이런 이상한 날씨와 식물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 여름에 태풍이 잦아 작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냉해까지 입었다는 화제에 다다랐다. 대표적으로 파농사가 흉작이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시장에서의 파의 가격은 4배 가량 올랐다. 채소가게에서는 김장철에 파를 1/2단씩 팔았다. 사람들은 직접 파를 키우기 시작했다. 파를 안 먹을 수는 없고, 파에 나가는 돈을 아껴야만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파키우기라는 소소한 행동으로 자급자족의 경제를 만들었다. 이에 사람들은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주로 마주했던 재테크라는 단어를 파에 붙여 파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파테크는 일상과 대비되는 거대 담론의 용어인 ‘테크’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 행위는 영혼을 끌어 모아 수십배의 돈을 벌려는 목적과 상이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물과 햇볕, 식물 뿌리라는 자연으로부터 빌린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작물의 축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에 넣어 소비하는 걸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파테크는 파의 유통과정 상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집 안에 정원을 만든다. 파를 키우며 경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는 셈이다.
위의 실천 가능성에서 우리는 파테크라고 하는 행동을 단순히 반짝 유행으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록을 해두어야 하는 사안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인간과 식물의 교류를 경유한 기후 변화를 살피면서 기후 문제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싶다.
지긋지긋한 서울의 일상
두 사람은 대학원생과 프리랜서로 한국에서는 백수처럼 취급되며,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주변부의 인물들로 정의된다. 그 까닭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이야기인 취업, 결혼, 주식 투자, 부동산에 흥미가 적다. 하지만 많은 대화가 위의 주제로 점철되어있는 상황 또한 현실이다. 둘은 비생산적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직업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는 한편 날씨나 식물과 같은 시시콜콜한 상황을 관찰하고 소식을 나눈다. 차와 홍은 대화를 통해 서울 생활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털어놓고 현재를 다시 인식한다. 두 사람은 이를 소소한 삶의 균형을 찾는 일상이라 정의한다.
거대하고 평준화된 체계 아래 바쁘게 흘러가는 서울 생활에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을 느끼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도 서로의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작은 실천이 홍과 차의 일상을 지켜준다. 둘은 삶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바라는 요구 너머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5월 말에 눈 오는 베를린에서 자라는 깻잎, 정글처럼 우거진 성미산을 관찰하며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논의를 횡단해 우리의 일상을 다시 불러내고 싶다.